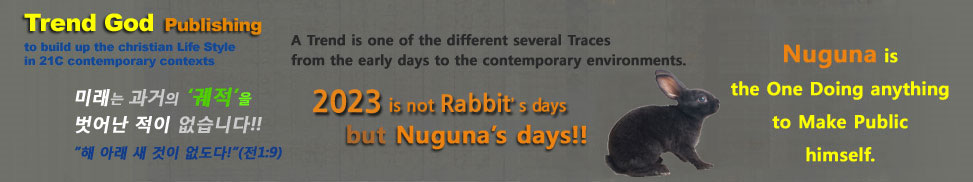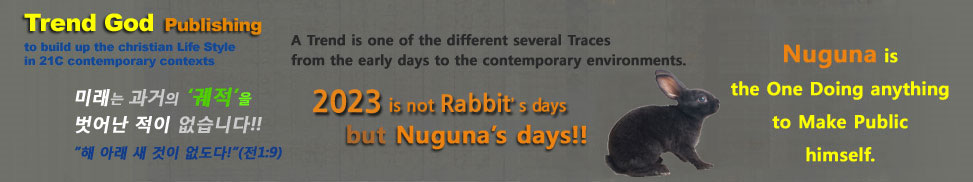|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엽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비행들로 사회가 들썩인다.
원인은 삶의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나름의 약한 부분을 가진 사람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 여겨진다.
마치, 풍선을 불면 약한 부분이 도드라지고 터지는 것처럼,
몸이 약하면 병이나 쓰러지고,
마음이 약하면 좌절해(OTL) 자살하고,
정신이 약하면 내적 질서와 균형이 와해되어 과도하거나 삐뚤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적 콘텐츠로, 사회적 시스템으로, 법적 환경 등으로 표출되어
또 다른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낸다.
결국, 2차, 3차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구태여 작금의 청와대,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군의 장교나 사병할 것 없이
각계 각층에서 신분의 고위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양태들을 떠올릴 것 없다.
다만, 사후양방문식으로 뒤쫓아가기에는 사태가 만만치 않음은 명시하려 한다.
2차, 3차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내는 제1의 열악한 환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대통령이 그 답을 주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의 이 한 마디가 사태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 진심이든 어떤 꿍꿍이가 있든지 간에 사태의 실마리가 분명하다.
세계화와 인터넷으로 시장(Market)이 하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나라의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름의 해법(?)을 찾았다.
그것은 모든 나라의 기업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다보스 포럼(Davos Forum), G20 정상회담, FTA 등
기업 중심의 세계화 시스템이 경제적 약자들을 시장(Market) 삼아
자기들의 기름진 배를 채우려 하고 있다.
이 흐름에서 경제적 약자들은 총체적 부실을 면치 못한다.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고양이 앞에 쥐 신세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체적 약자, 부분적 약자들의 삶의 환경은
열악(terrible) 그 자체이다.
이런 환경에서 어느 누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살겠는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사회환경과 시스템이
교육, 문화, 정신 및 기타 생활 환경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동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해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다.
경제적 강자가 약자들을 위한다는 것은 동정과 기부 그 이상이기 어렵다.
결론 부터 말하면, 약자들의 해법은 문화와 예술이다.
시스템으로는 물량과 기술의 힘을 당해낼 수 없다.
세계화란 기업이 자신이 유리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약자들도 이제는 이 경기장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고대 랍비들의 교육서인 탈무드에 있는 내용 중 하나이다.
손님이 목수에게 탁자 1개 만드는 가격을 묻고는
탁자 5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목수는 탁자 6개 값을 요구하였다.
손님이 의아해 하면서 그 이유를 물으니,
목수는 자기는 일주일에 4개만 만들면 부족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엔 자기 자신과 또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당신이 1개를 더 만들 시간 만큼 내 시간을 요구하였으니 그 값을 내라는 것이다.
그렇다. 기업의 논리는 대량생산이고 무조건 많이 사면 좋아한다.
소비 중심의 문화이며, 가치 보다는 기능과 효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기업이 힘을 발휘하기 좋은 환경인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소비에 능한 소비자'를 만들어 내야 한다.
소비에 능한 소비자는 물건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새로 사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더 편하고 더 빠르다.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과 비슷하지 않은가?
근검절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골동품에 대한 매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물질주의'와 '생산주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물질주의'는 소비주의를 의미한다.
거기에는 물질이 소비되는 가치만 있을 뿐이다.
독자중엔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을 것이람?' 하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생산주의'에서는 완성된 구입/판매만이 아니라,
'생산 이전의 과정', '생산의 과정' 그리고 '사용되는 과정'의 가치를 논한다.
물건이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활과 사람의 인격과 함께 길을 가는 동행자로서의 차원이다.
유럽 특히 북 유럽 사람들은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라이프스타일이 있다.
그런 문화와 그런 삶의 환경이 있다.
유럽 문화의 기풍은 그런 맛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풍은 있다.
미국은 유럽과 또 다르다. 거긴 소비 천국의 문화가 깃들어 있다.
하지만, 그런 미국도 우리나라 보다는 '물질주의'가 심하지 않다.
'생산주의'는 느림의 미학과 맞닿아 있다.
'생산주의'는 물건에 인격을 담는 장인정신과 맞닿아 있다.
'생산주의'는 영혼을 빚는 예술혼과 맞닿아 있다.
누가 이런 마당을 만들 것인가?
예전에 어린이들이 놀던 '동네 공터'가 어른들의 주차장으로 점령당한 것처럼
지금 세계는 '동네 상점'이 문을 닫고 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마당'이 절실한 환경이다.
세계화가 짚밟은 공터 잃은 세상에 작은 마당 하나 심어 놓는다면,
그곳이 생명 넘치는 삶의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 올 것이다.
기업은 그 느린 속도를 견디지 못한다.
'너는 소비자'란 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대상화 해서는 동행하지 못한다.
요즘은 치과에 가도 바로 치료해 주지 않는다.
고객을 만든다.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신경치료를 해야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더니,
오늘은 목요일이니 내일은 안되고 5일 뒤로 예약하고 오란다.
아마도 그 때 쯤이면 꼭 신경치료 해야 될 상황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돈을 쓴다.
|